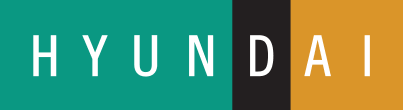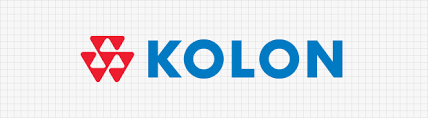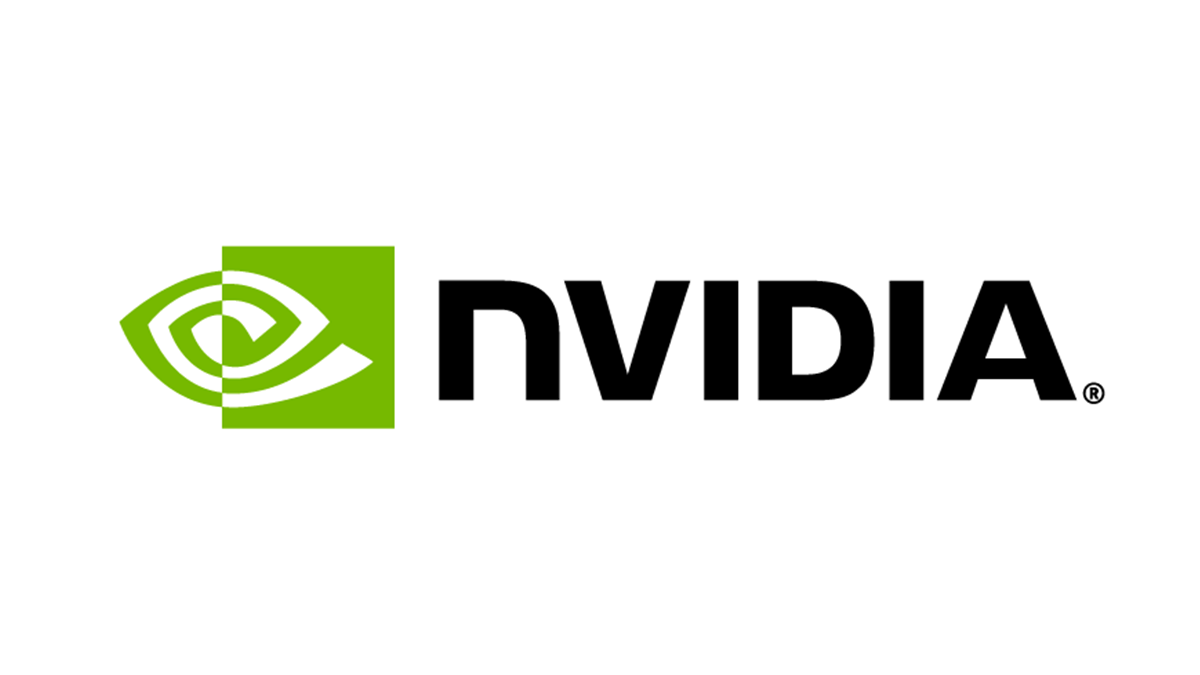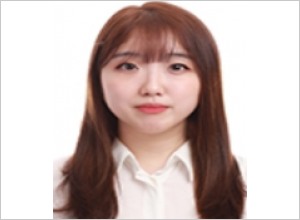신기술은 ‘특허기술’과는 차원이 다르다. 특허는 ‘아이디어’ 수준이어도 취득될 수 있는 반면에 신기술은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지정될 수 있다. 특허는 1명의 심사로 가능하지만 신기술은 10~12명이 3차례에 걸쳐 '깐깐하게' 심사한다.
또한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신기술 개발비는 5억~10억원, 개발 기간은 3~5년 걸린다고 한다.
이 정도 투자금과 개발기간은 작은 기업에겐 회사의 존폐가 달린 '모험'일 수밖에 없다. 신기술은 작은 기업에겐 국내외 대기업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비장의 무기’이자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겐 세계시장에 생존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의 원천’이다.
하지만 국내 건설현장은 개발자들의 애를 바짝 태울 만큼 '신기술'에 소극적이다.
보수적인 건설업계 특성상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데 모두들 주저한다. 초기 비용이 기존 기술보다 높은 경우에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공공기관 발주처에게 좋은 핑계거리로 작용한다.
특히 국토교통부를 필두로 한 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공부문 건설사업 현장의 행정편의주의와 무사안일주의는 신기술이 발디딜 틈조차 확보하기가 힘들다고 기술개발 관계자들은 하소연한다.
오죽하면 일부 발주처 담당자들이 신기술과 특허의 차이조차 구분하지 못해 피해를 본다는 말이 나올 정도일까.
큰 돈을 들여 신기술 인증을 받아놓고 현장에서 적용되기만 하세월 기다리다 폐업하는 기술회사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개발업체 사이에서 '좌절감'이 만연해 있다고 전해진다. 실제로 지난해 건설신기술 신규 지정건수는 23건으로 연평균 30건보다 줄었다.
매번 정부가 바뀌면 산업계나 과학계나 혁신정신을 촉구하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슬로건처럼 강조된다. 그러나 정작 현장의 실질적 지원이 개선되는 않는 한 신기술 개발자의 위축은 되풀이될 것이다.
건설공사 현장에 우선 적용하라는 건설교통 신기술제도의 근거법인 건설기술진흥법이 있어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데 따른 패널티가 없어 사실상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컷 우수 신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운영 및 판로확보 자금이나 지원이 없어 폐업을 감수해야 하는 ‘데스 밸리(Death Valley·죽음의 계곡)’는 IT 벤처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건설 신기술 개발자들이 ‘죽음의 계곡’을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정부와 발주처 등 지원기관의 ‘신(新)행정’을 기대해 본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