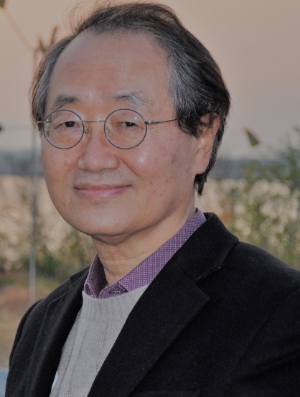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그런데 소울푸드를 먹고 났더니, 늘 ‘음식윤리’의 ‘눈’으로 음식을 보던 내 모습이 부끄러워졌다. 마치 ‘강력계 형사‘가 순진무구한 사람을 죄인으로 의심하듯 음식을 대하지 않았던가? 명태 안에 ‘납’이라도 들어있을지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다수의 ‘정상’을 극소수의 ‘비정상’처럼 대한 건 아닐는지….
예부터 삶의 이상적 목표를 진선미(眞善美, 참됨과 착함과 아름다움)라고 했는데, 내가 먹은 소울푸드, 생태탕은 진선미를 넘어, 이미 내 영혼까지 건드리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 나는 생태탕이 진과 선을 지키지 않을까 봐, 즉 음식윤리에 어긋날까 봐 안달하는 셈이니 안쓰러울 뿐이다.
과연 생태탕의 무엇이 내 영혼을 어루만지는 걸까? 참됨도 아니고 착함도 아니고, 바로 “맛” 아닐까? “맛”은 모양이나, 냄새, 국물의 온도 등 작은 아름다움을 모두 포함하는 큰 아름다움이다. 그렇다면 생태탕의 맛이야말로 미에 해당하는, 가장 큰 아름다움의 가치가 아닐는지.
그래서인가? 사람은 진인(眞人, 참된 사람), 선인(善人, 착한 사람), 미인(美人, 아름다운 사람)으로 구분하면서, 음식은 진식(眞食, 참된 음식), 선식(善食, 착한 음식), 미식(美食, 아름다운 음식)으로 구별하지 않는다. 단지 미식만이 통용되는 용어인데, 이는 미식이 진식과 선식을 아우르기 때문이다.
왜 그런지는 언어와 관련된 오래된 문화라 알기 어렵다. 다만 예부터 음식은 ‘당연히’ ‘참된’ 음식이고 ‘착한’ 음식이라고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 당연하던 음식이 ‘당연하지 않게’ ‘참되지 않은’ 음식이나 ‘착하지 않은’ 음식이 되었기에, 음식윤리라는 ‘매의 눈’으로 흘겨보게 된 것이 아닐는지…. 아무튼 미식은 진선미가 다 포함된 큰 표현이라 볼 수 있다.
매사에 순서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진선미마저 ‘수우미’처럼 등급화하는 것 같다. 진이 선보다, 선이 미보다 높은 가치일 수 없다. 철학, 윤리, 예술 사이에 높낮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음식의 경우는 좀 다르다. 음식이 진식, 선식 없이 미식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미’야말로 ‘진과 선’을 아우르는 큰 개념, 즉 작은 진선미를 순서 없이 포함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흔히 미식을 ‘맛난 음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맛난 음식’이라는 작은 개념에서 벗어나, 원래의 큰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미(美)라는 한자어는 ‘크고(大) 살찐 양(羊)’을 합친 말로, ‘보기 좋다’에서 출발해 ‘아름답다’를 뜻한다. ‘보기 좋다’는 신에게 바치는 크고 살찐 양의 진선미를 아우르는 표현이다.
음식을 신에게 바치는 행위에서 소울푸드가 기원했을는지 모른다. 여기에는 인성이 신성을 향해 초월하고자 하는, 영혼의 염원이 담겨 있다. 현대인에게 소울푸드는 양고기든, 생태탕이든 뭐든 다 좋다. 다만 가곡 ‘명태’의 가난한 시인처럼 영혼의 염원으로 먹으면 된다.
김석신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