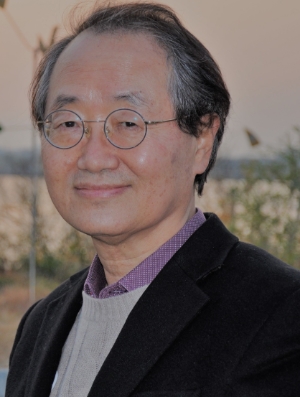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만약 오징어가 사람이라면 명예훼손이라고 언성을 높일 법하다. 명예훼손이란 이름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 손해를 입히는 것이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언급하는 행위니 말이다. 그동안 군소리 없이 한국 사람의 밥상에 오른 오징어 입장에 서보자. 돈 없고 죄 없는 오징어의 변호인처럼.
단초는 영화로도 유명해진 옛 책에 있다. 정약전은 <자산어보>에서, 중국 남북조 시절 심회원의 <남월지>에 나온 이야기를 인용해 오징어를 설명했다. “오징어는 까마귀를 즐겨 먹는다. 물 위에 둥둥 떠서 죽은 체하며 까마귀를 현혹한다. 까마귀가 날다가 오징어가 죽은 줄 알고 달려든다. 그 순간 오징어가 발로 휘감아서 물속으로 끌고 가 먹는다. 그래서 ‘까마귀를 잡아먹는 도적’이라는 뜻의 ‘오적(烏賊)’이라고 했다.”
그래서 ‘오적어’란 이름을 얻었고, 이것이 오징어가 됐다는 것이다. 월간조선(2021.11.16.)에 따르면, 1920년대 말부터 문어체 ‘오적어’와 구어체 ‘오징어’가 일상에서 함께 쓰이다가, 점차 오징어로 부르게 됐다고 추측했다.
“말도 안 돼!” 오징어의 항변을 들어보자. 오징어는 야행성이다. 낮에는 깊은 바다에 머물고 밤에 주로 움직인다. 오징어잡이 배들이 밤에 불을 환히 켜면 동물성 플랑크톤이나 작은 물고기가 불빛을 향해 움직이고 이를 먹으려고 오징어가 몰려든다. 그런데 어떻게 오징어가 낮에 물에 둥둥 떠서 죽은 척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갈매기도 아닌 까마귀가 먼 바다까지 먹이 사냥을 나선단 말인가? 설령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는가?
오래전(550년 즈음) <남월지>에 나온 비합리적인 옛이야기를, 정약전은 1200년 이상 지난 1814년에 무비판적으로 <자산어보>에 인용했다. 그렇다면 재미있는 옛이야기를 인용한 정약전, 이미 돌아가신 분에게, 허물을 물어야 하겠는가? 아니면 200년 후손인,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우리에게, 허물을 물어야 하겠는가? “모르고 했지, 고의로 했나?”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만, 오징어가 사람이라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까?
게다가 1614년 이수광의 <지봉유설>에 따르면, “오징어 먹물 글씨는 해가 지나면 사라져 빈 종이가 되므로, 사람을 속이는 자가 이용한다. 그래서 지키지 않은 약속을 ‘오적어 묵계(墨契)’라고 한다.” 현대인은 먹을 쓰지도 않으면서, 이 말을 인터넷에 올린다. 오징어는 항변한다. “내 먹물은 멜라닌 천연색소다. 당연히 세월이 지나면 탈색된다. 이를 이용한 자가 나쁘지, 왜 내 명예가 훼손되어야 하는가?”
다행스럽게 권오길 교수의 ‘생물산책’에 이런 온건한 설명이 있다. “오징어를 오적어(烏賊魚), 묵어(墨魚)라고도 불러왔는데, 이 두 말을 풀어보면 ‘도적을 만나면 검은 먹물을 내뿜는다’는 의미가 들어 있는 듯하다.”
이제 윤동주 ‘서시’의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해보자. 혹시 오징어 생김새가 물고기 같지 않아 차별하는 건 아닌지. 오징어가 비늘이 없다고 차별하는 건 아닌지. 흑인 노예를 차별하면서 노동에 부려먹듯, 차별하면서 맛있게 먹어온 건 아닐는지.
김석신 가톨릭대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