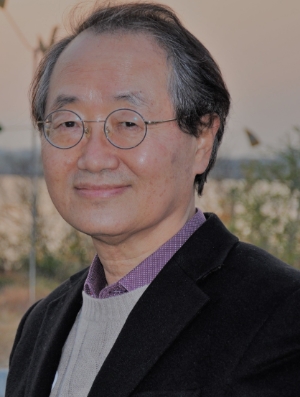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이럴 때는 이찬범 화가의 시 '어머니'를 읽어보자. 『어머니』 이찬범 화가. “밥 부뚜막에서 밥 짓는 어머니는/ 연기가 맵다며 항상 우셨다./ 그 눈물은 자식을 배 불리는 안도의 눈물이었고/ 배곯지 않게 해야 하는/ 고단함의 눈물이었다.// 그렇게/ 평생 밥을 짓던 어머니/ 돌아가시던 날/ 내 손 꼬옥 잡고 힘겹게 물으셨다./"밥은... 먹었느냐"고/ "어여... 밥 먹으라"고."
어머니는 자식이 배곯지 않게 무던히도 애쓰신다. 어머니에게 자식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을까? 당신의 입보다 자식의 입이 먼저인 어머니의 몸짓을 '모성애'라고 가볍게 말하지 말라. 신이 자식 사랑을 명하기 전에, 아니 명하지 않더라도, 어머니는 자식을 먹인다. 어머니에겐 당신의 생명보다 자식의 생명이 먼저다. 자식은 어머니의 생명을 먹으면서 산다.
어머니는 자식을 배불리면서 안도의 눈물을 흘린다. 그 눈물은 너무나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눈물이다. 자식이 행복하면 어머니도 행복하고 자식이 고통스러우면 어머니도 고통스럽다. 어머니는 자식이 배부르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예민하게 아신다. 그래서 어머닌 자신의 행복을 자식의 밥에 몰래 비벼 넣는다. 자식은 어머니의 행복을 먹으면서 산다.
어머니는 온종일의 고단함과 바꾼 밥 냄새에서 하늘의 지혜를 맡는다. 밥이 하늘인데, 하늘 같은 밥을 먹었냐고, 안 먹었으면 어서 먹으라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자식에게 지혜를 가르치신다. 자식은 어머니의 지혜를 먹으면서 산다.
아버지는 어떤가? 어머니처럼 자식을 몸속에서부터 기르지 않았지만, 자식이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 아버지의 자식 사랑도 대단하지 않겠는가? 황규관 시인의 '어느 저녁때'를 한번 읽어보자. 『어느 저녁때』 황규관. "땅거미가 져서야 들어온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 뛰노느라 하루를 다 보내고/ 종일 일한 애비보다 더 밥을 맛나게 먹는다/ 오늘 하루가, 저 반 그릇의 밥이/ 다 아이들의 몸이 되어가는 순간이다/ (중략…)/ 그 후 내 生은 아이들에게 이전되었다/ 그러다 보면 열어놓은 창문으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리라/ 오랜만에 둥그렇게 앉아/ 아이들의 밥 위에 구운 갈치 한 토막씩 올려놓는다/ 잘 크거라, 나의 몸 나의 生/ 죽는 일이 하나도 억울할 것 같지 않은/ 시간이 맴돌이를 하는 어느 저녁때다"
아아, 자식은 종일 일한 아버지보다 밥을 더 맛나게 먹는다. 그 밥이 자식의 몸이 된다. 아버지의 생은 아이들에게 이전된다. "잘 커라, 나의 몸 나의 生" 자식은 아버지의 생명과 행복과 지혜를 먹고 자란다. 아버진 말한다. 죽는 일이 하나도 억울할 것 같지 않다고. 그러면서 아버진 자식 밥 위에 구운 갈치 한 토막씩 올려놓는다.
그렇다. 자식은 밥을 먹으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생명과 행복과 지혜를 함께 먹는다. 그러면서 살아간다. 문득 "사람은 혹시 식인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 삶을, 어머니와 아버지의 생명과 행복과 지혜의 살을 먹는, 그런 식인종 말이다. 우리는 평생 87.6톤을 먹는다고 한다. 도대체 그 많은 밥이 어디에서 왔겠는가?
김석신 가톨릭대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