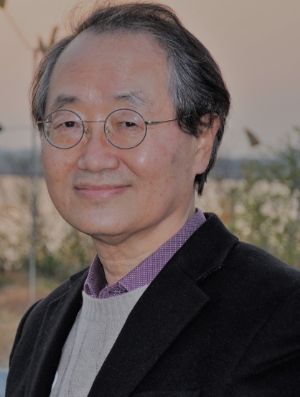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아침마다 이렇게 음식과 하나가 된다. "아아, 이렇게 먹고 죽으면 자연사야." 아침에 종종 하는 말이다. "이야말로 소확행이지." 후렴처럼 붙는 말이다. 은퇴했으니 출근에 쫓길 일도 없고, 설거지나 환기와 청소도 서두르지 않아 편안하다. 이제 더는 직장동료들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창을 열면 신선한 바람이 들어와서 좋다.
그런데 매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자기실현을 향해 나아가고, 심지어 6단계의 경우 자기 초월까지 향한다. 문제는 자기실현이든 자기 초월이든, 결핍 욕구를 못 채우면, 다시 생리적, 안전, 소속감, 자기존중의 욕구로 내려간다는 데에 있다.
여기서 식욕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자. 식욕은 분명 생리적 욕구지만, 음식에 대한 욕구가 여기만 해당하진 않는다. 군대의 초코파이는 생리적 욕구를 반영하지만, 위생적인 음식 추구는 안전의 욕구를, 가족이나 직장의 밥상공동체는 소속감의 욕구를, 입학‧졸업‧진급 등의 축하 음식은, 심지어 짜장면이나 햄버거마저도, 자기존중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다.
여기서 소확행의 등장 배경을 생각해 보자. 소확행은 소득의 양극화 심화, 계층 간 이동의 어려움 등의 사회 구조적 문제와 관계가 깊다. 구조적으로 자기실현의 욕구를 채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핍 욕구를 반복적으로 채우려는 안타까운 모습에서, 그리스 신화의 시시포스를 떠올릴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스스로 질문해보자. "행복하세요?(Are you happy?) 행복하다고 느끼세요?(Do you feel happy?)" 행복함(being happy)을 A라고 하고, 행복감(feeling happy)을 B라고 하면, 네 가지 경우(A+B+, A+B-, A-B+, A-B-)를 가정할 수 있다.
(1) 행복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경우(A+B+)는 가장 바람직하다. 결핍 욕구를 다 채우고 자기실현을 하는 사람일 수 있다. (2) 행복한데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A+B-)는 바로 옆의 행복을 두고 자꾸 먼 곳의 파랑새를 찾는 사람일 수 있다. (3) 행복하지 않으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경우(A-B+)는 정서적으로 균형잡히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 (4) 행복하지도 않고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A-B-)는 행복과 거리가 먼 사람일 수 있다.
소확행과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마도 경우(3)일 것이다. 도대체 왜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첫째는 의미와 재미가 균형을 이루지 않기 때문이다. 맛집 탐방은 재미있지만 불룩한 뱃살은 의미를 주지 않는다. 둘째는 행복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맛있는 대게를 먹으러 먼 곳까지 반복적으로 갈 수는 없지 않겠는가? 셋째는 맛있는 음식으로 주관적 행복은 얻을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자기를 실현하는 객관적 행복은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것은 개인이 아닌 사회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한 구조적 문제다.
언제쯤일지 모르겠으나, 누구나 먹음의 소확행으로 재미와 의미가 균형 잡힌 행복한 삶을 살면 좋겠다. 이것이야말로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는 길 아니겠는가?
김석신 가톨릭대 명예교수


























